[글로벌 외식정보=진익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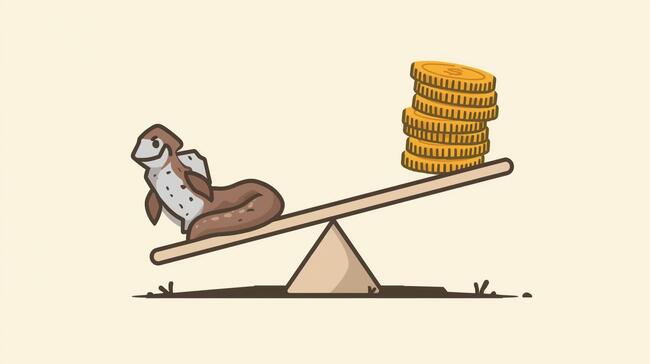
우리가 '식당'을 떠올릴 때 그리는 풍경은 익숙합니다. 정성껏 요리하는 주방,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한 직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홀. 우리는 식당업의 본질을 '환대(Hospitality)'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익숙한 풍경과는 정반대의 식당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직원의 서빙 대신 직접 접시를 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장의 주된 관심사는 '최고의 맛'보다는 '테이블당 원가율'입니다. 본전(本錢)을 뽑으려는 고객과 이윤(利潤)을 남기려는 사장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입니다.
고급 보양식의 상징인 '장어'와 박리다매의 끝판왕인 '무한리필'이라는,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두 개념이 결합된 이 기묘한 업태. 과연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1. [도입] 익숙함 vs. 생소함
일반적인 장어 전문점은 비싼 가격 때문에 특별한 날 찾는 곳입니다. 직원이 정성스레 구워주는 장어를 한 점 한 점 음미하며 먹습니다. 경영자는 객단가(客單價)를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에서 '음미'나 '환대'는 부차적인 가치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전투적입니다. 고객은 지불한 가격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사장은 그 한계선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분주합니다. 사장의 시선은 우아한 서비스가 아닌, 셀프바의 리필 속도와 고객 테이블 위 쌓여가는 뼈의 양에 꽂혀 있습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2. [핵심 원리]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장어 무한리필 모델은 '불황'과 '가심비(價心比)'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지만, '제대로 된 한 끼'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장어처럼 '비싸지만 몸에 좋다'는 인식이 박힌 고가 식재료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이 모델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핵심 가치는 '고급 식재료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해제'입니다. 가격 걱정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비싼 장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가심비의 극대화'가 고객을 끌어들입니다.
사장에게 제안하는 가치는 명확합니다. '고가 식재료를 미끼로 한 압도적인 집객력과 박리다매의 유혹'입니다.
3. [구체적 사례] 업태의 분화
무한리필 업태는 제공 방식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초기에는 직원이 리필해주는 방식도 있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 '셀프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화했습니다.
100% 셀프형: 장어 원물부터 모든 반찬, 음료까지 고객이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입니다.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원가율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형: 첫 상차림은 직원이 제공하고, 추가 리필부터 셀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려는 모델입니다.
주류/사이드 집중형: 장어 자체는 미끼 상품(Loss Leader)에 가깝게 저마진으로 운영하고, 주류 판매나 추가 유료 사이드 메뉴(장어탕, 냉면 등)에서 핵심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4. [보이지 않는 문제점] The Core: 사장의 진짜 과업
예비 창업자는 '장어 싸게 떼와서 많이 팔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진짜 과업은 주방이 아닌, 계산기 앞에서 시작됩니다.
원가율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장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날씨, 계절, 어획량,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생물(生物)'입니다. 일반 식당은 원가가 오르면 판매가를 올리거나 양을 줄이면 되지만, '무한리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가격 인상은 집객력 붕괴로, 품질 저하는 업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사장은 요리사가 아니라, 매일 장어 시세를 확인하고 수급처와 씨름하는 '원자재 트레이더(Commodity Trader)'가 되어야 합니다. 10%의 원가 상승이 10%의 이익 감소가 아니라, '적자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 '잔반(殘飯)'과의 전쟁: 무한리필의 수익은 고객이 '먹은 양'이 아니라 '가져간 양'에서 결정됩니다. 고객이 접시에 담았지만 먹지 않고 버리는 모든 장어는 그대로 사장의 손실(Loss)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담금' 같은 제도를 두지만, 이는 고객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장의 핵심 과업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딱 먹을 만큼만, 기분 나쁘지 않게 가져가도록 유도할까?'를 설계하는 '운영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셀프 서비스의 함정: 노동 강도의 전가: '셀프 서비스 = 직원이 필요 없다'는 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서빙 인력이 줄어든 만큼, 주방과 홀 관리 인력의 노동 강도는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고객 수십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셀프바는 10분만 방치해도 전쟁터가 됩니다. 장어와 반찬은 '떨어지기 전에' 채워야 하고, 바닥은 '더러워지기 전에' 닦아야 합니다. 직원은 손님을 응대하는 대신, 쉴 새 없이 음식을 채우고 치우는 '고강도 보급 담당자'가 됩니다.
회전율의 딜레마 (The Rotation Rate Dilemma): 박리다매 모델의 생명은 '테이블 회전율'입니다. 하지만 '무한리필'은 본질적으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뽕을 뽑기 위해 천천히, 오래 먹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사장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2시간 이용 제한' 같은 규칙을 걸지만, 이는 '무한'이라는 가치와 충돌하며 고객의 심리적 저항을 낳습니다. 손님을 더 받아야 하는데 자리가 나지 않는, 저녁 피크타임의 역설에 갇히게 됩니다.
5. [더 깊은 함의] 경영 철학의 문제
장어 무한리필을 선택하는 것은, 경영자로서 명확한 '철학적 트레이드오프'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음식'이 아닌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장어를 완벽하게 구워내는 장인정신(Craftsmanship) 대신, 수백 마리의 장어를 손실 없이 공급하는 물류(Logistics)와 효율(Efficiency)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 대신 '계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골손님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대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라는 '데이터'에 기반해 트래픽을 유도합니다. 이곳에서 환대(Hospitality)는 핵심 가치가 아니며, 사장은 손님을 '손님(Guest)'이 아닌 '원가 변수(Cost Variable)'로 바라보게 될 위험이 큽니다.
6. [대안과 그 비용] 문제 해결의 역설
그렇다면 4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대안'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듭니다.
[문제] 불안정한 장어 원가
[대안] 더 저렴한 냉동 장어나 낮은 등급의 장어를 사용한다.
[비용] '고급 보양식 장어'라는 핵심 가치(2번)가 무너집니다. 고객은 즉각 품질 저하를 알아채고, '가심비'는 '가성비'로 추락하며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문제] 높은 잔반(음식물 쓰레기)
[대안] '1회 리필만 가능' 혹은 '테이블당 총량 제한'을 둔다.
[비용] '무한리필'이라는 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객 기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강력한 집객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 낮은 회전율과 긴 체류 시간
[대안] 직원이 직접 구워주며 리필 속도를 조절하고, 이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비용] 인건비가 폭증합니다. 이는 셀프 서비스를 통해 수익 구조를 맞추려던 초기 설계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며, 새로운 비용(인건비)이 기존의 문제(원가율)를 압도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른 쪽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7. [의외의 장점 및 결론] Twist: 본질의 재정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성공할 경우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케팅의 단순성'과 '강력한 현금 흐름'입니다. '장어 무한리필'이라는 간판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메시지입니다. 복잡한 홍보 없이도 고객은 이 간판 하나만 보고 몰려듭니다. 또한, 저녁 장사와 주류 판매에 집중되는 업태 특성상, 성공적인 매장은 높은 객단가와 강력한 일일 현금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익은 주류와 사이드 메뉴에서 나옵니다.)
결국,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성스러운 장어 요리'를 파는 환대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동성 높은 원가'와 '고객의 무제한적 욕구'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매일 수익이라는 한 줄을 타는 리스크 관리업(Risk Management)이자 극한의 재고 관리업(Inventory Management)입니다.